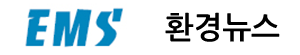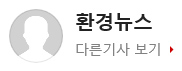종합뉴스
 HOME
HOME- 종합뉴스

- 종합뉴스
대기에서 먹는물 생산…세계 물 위기 해법 될까
사막에서도 물 만들지만 에너지 효율성 등이 문제 … 도심지와 같이 오염된 지역 안전성 확보도 해결 과제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대한민국도 직격탄을 맞았다. 강원도 강릉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제한급수는 물론 재난사태까지 선포됐다. 지난 주말 강릉에도 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와는 무관하게 여겨지던 물 부족 문제가 극한기상으로 인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위험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전세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세계 5대 위험 중 하나로 ‘물 위기’가 꼽혔다. 또한 ‘유엔(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 2019’에서는 전세계적으로 2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인구 증가와 가속화하는 기후변화로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대기 수분 추출(Atmospheric Water Generation, AWG)’ 기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공기 중의 습도를 포집해 먹는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15일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마켓츠(Research and Markets)’의 ‘대기 수분 생성기 시장 보고서 2025(Atmospheric Water Generator Market Report 2025)’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은 17.49%로 지난해 15억9000만달러 시장으로 성장했다. 또한 2030년까지 41억8000만달러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활용해 효율 향상중 =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스페리컬 인사이츠(Spherical Insights)’의 ‘2025년 전세계 대기수 생성기 시장의 상위 50개 기업: 시장 조사 보고서(2024~2035년)’에 따르면, 기존 AWG 기술은 높은 에너지 소비량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통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영 비용을 절감해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AWG 기술 시장의 경우 △이콜로블루(EcoloBlue) △워터젠(Watergen) △제나크 테크놀로지(GENAQ Technologies S.L.) △드링커블 에어 테크놀로지(Drinkable Air Technologies) 등이 경쟁 중이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인 CES 2019에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어워드(Best of Innovation Award)를 수상한 워터젠이 대중에게 공개한 기술 설명서에 따르면 1kwh로 물 5ℓ를 생산할 수 있어 기존 대비 효율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에너지 집약적인 특성을 갖는다.
‘2025년 전세계 대기수 생성기 시장의 상위 50개 기업: 시장 조사 보고서(2024~2035년)’에서는 “AWG 기업들은 고급 건조제 및 열교환기와 같은 소재 혁신을 통해 용수 생산량이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스마트 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등과의 접목은 모니터링 및 최적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Science Advances)에 실린 논문 ‘사막 공기로부터 실용적인 물 생산(Practical water production from desert air)’에 따르면, 특수 소재인 금속유기구조체(MOF)를 활용해 사막에서 공기로 물 만들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밤에 MOF가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고, 낮에 태양열로 가열되어 수증기를 방출한 뒤 응축시켜 물을 얻는 원리다.
각설탕 크기의 MOF는 축구장 6배 면적에 해당하는 다공성 표면적을 가져 효율적인 수분 흡수가 가능하다. 용도에 따라 기공 크기나 화학적 성질을 정밀 조절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공동연구진은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사막에서 상대습도 8~40% 환경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지르코늄 기반 MOF-801 소재 1㎏으로 하루 100g의 물을 수확했다. 새로 개발한 알루미늄 기반 MOF-303의 경우 175g까지 생산 가능했다. MOF-303은 원료비를 1/150로 줄이면서도 물 생산량은 2배 늘린 차세대 소재다.
이 논문의 연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MOF를 활용한 사막에서 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한 연구도 있다. 지형이나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수자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지가 필요하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워터(Nature Water)’의 논문 ‘MOF 수분 수확기, 주변 햇빛을 이용해 데스밸리 사막 공기에서 물 생산(MOF water harvester produces water from Death Valley desert air in ambient sunligh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 밸리 국립공원과 버클리에서 MOF-303 소재 1㎏당 하루에 각각 210g 및 285g의 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이 물을 수확하기 위해 사용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가 유일하다.
◆다량으로 기술 적용 시 생태계 영향 고민 =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트어스 인사이츠(StartUs Insights)’의 보고서 ‘2025년 주목해야 할 대기수 생산 기업 및 스타트업 10선(10 Top Atmospheric Water Generation Companies and Startups to Watch in 2025)’에 따르면, 다중 AWG 시스템의 네트워킹을 통해 과거보다는 많은 양의 물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스마트 그리드처럼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절과 최적화가 구현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등의 접목으로 AWG 시스템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실시간 습도 모니터링 △예측 유지보수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해지면서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가 오염된 환경에서 물 수확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을 때 다량으로 대기에서 물을 수확하게 될 경우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학술지 ‘인바이런멘털 폴루션(Environmental Pollution)’에 게재된 논문 ‘산업 대기오염이 대기 물 생산 질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Industrial Air Pollution on the Quality of Atmospheric Water Production)’에서는 “오염된 산업지역에서 AWG 기술이 수확한 물을 분석한 결과 음용수로 크게 문제없다고 분석했지만, 대규모 실제 환경에서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학술지 ‘워터(Water)’의 논문 ‘도시 환경에서 대기수 생성기(AWG)를 사용하여 안전한 식수 생산(Producing Safe Drinking Water Using an Atmospheric Water Generator (AWG) in an Urban Environment)’에 따르면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에서 AWG기술을 활용해 수확한 물이 음용수 기준을 충족했다.
연구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서 AWG 장비로 생산한 물 64개 샘플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산된 물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이스라엘 음용수 기준을 충족했다. 주요 검출 성분은 △암모늄 △칼슘 △황산염 △질산염 등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하지만 니켈의 경우 7회에 걸쳐 이스라엘 음용수 기준(20㎍/ℓ)을 초과해 최대 677㎍/ℓ까지 검출됐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인근 차량 배기가스와 연료 연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벤조피렌도 1회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이는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폐암 등 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다. 논문에서는 “도시 지역의 교통량이 많은 환경에서도 AWG 기술이 대체로 안전한 식수를 생산할 수 있지만,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